2025년 궐위 대선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보수진영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배경에 주목한 이 연구는,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과 정파적 양극화가 이례적인 투표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왜 진보 후보가 아닌 대안적 보수 후보를 택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질적 위기’를 경고한다 .
2025년 대선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대한 탄핵이 이어진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조기 실시된 궐위 선거였다. 여론은 전반적으로 계엄에 부정적이고 탄핵에 긍정적이었으며,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결과 자체는 예견된 바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의외의 측면을 보여준다. 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가 41.2%를 득표하며 선전했고,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하면 보수 후보들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의 지지를 받은 셈이다 .
이 연구는 그러한 결과가 단순한 조직 동원이나 정당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핀다. 이는 단순한 보수-진보 구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연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 선거 직후 전국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이념 성향,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실제 투표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다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했다. 이념 및 정당 성향은 통계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 선택에 뚜렷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인식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고 인식한 보수 유권자조차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거나 기권한 경향이 높았다 .
또한, 정파성에 따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엄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고 탄핵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계엄과 탄핵 모두에 비판적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 유권자 다수는 권위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
특히 연구에서 주목한 바는, 보수 유권자 내에서도 민주주의 인식이나 계엄·탄핵에 대한 입장에 따라 후보 선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대안 보수후보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권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즉,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하거나 체제에 냉소적인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반응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자체의 작동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
예컨대, 보수 유권자 중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투표행태를 예측한 결과,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거나 체제에 무관심한 이들은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기권할 확률이 높았다. 보수 유권자 내에서도 민주주의 인식의 미비가 ‘대안의 선택’이 아닌 ‘불참’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내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정파적 양극화가 단지 정당 간의 경쟁이 아니라, 유권자의 민주주의 규범 인식과 투표 참여의 양상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체제 위기 상황에서도, 보수 유권자 다수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유지하거나 대안적 보수후보보다 기권을 택했다. 이는 유권자 내부의 이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당파적 충성심이 후보 선택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결국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정치 체제에 대한 냉소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협치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
논문: https://doi.org/10.56115/RIAS.2025.9.34.3.143
유튜브:
https://youtu.be/JcbmC--n_rI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lUxoen
2025 궐위 대선, 정파적 양극화가 만든 보수의 ‘선택 불능’
엄기홍 기자
|
2025.10.22
|
조회 211
탄핵과 계엄 속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보수후보 선택에 실질적 영향 미치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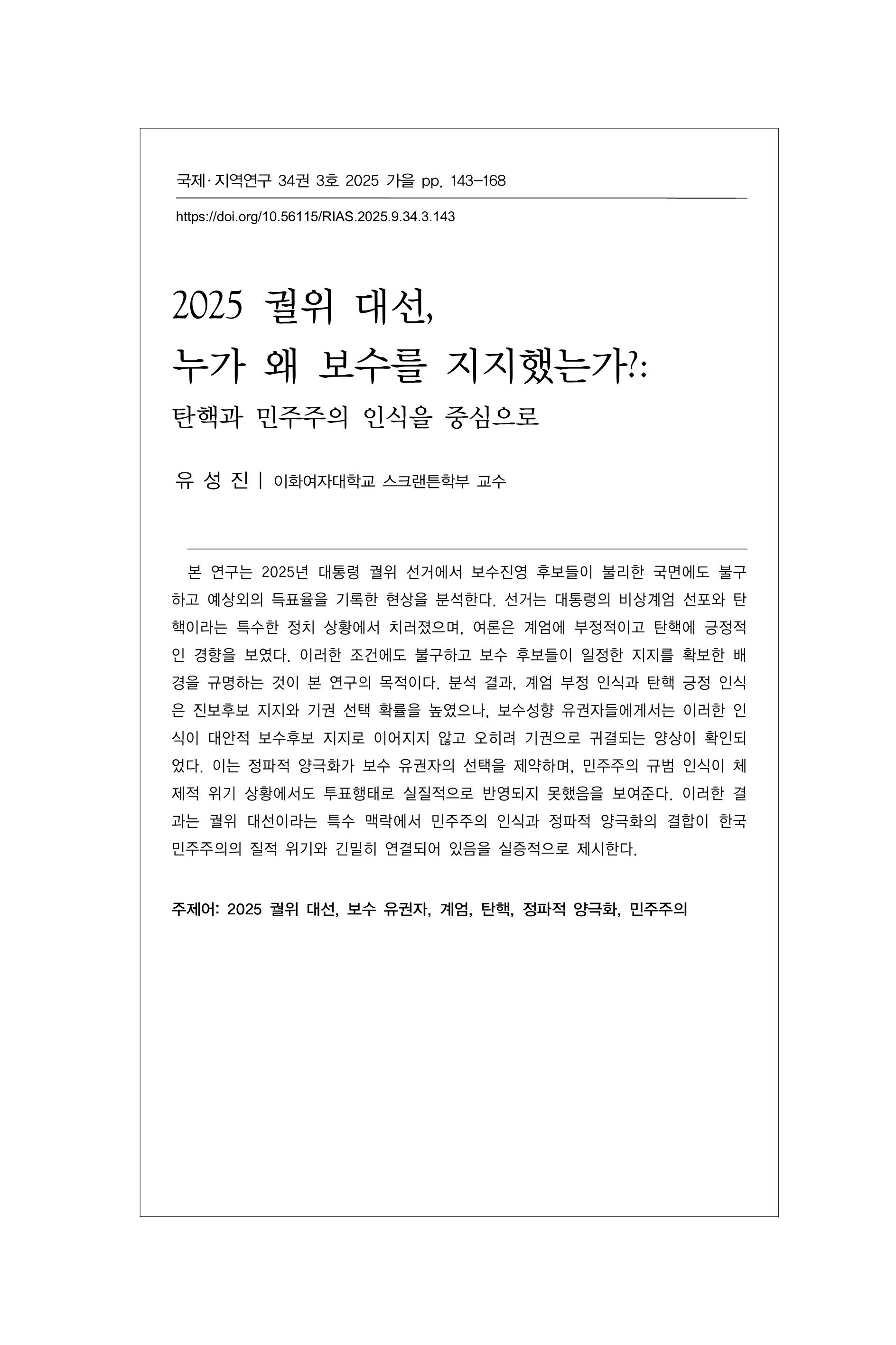
출처: 국제·지역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