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이라크 전쟁 중 쿠웨이트 유조선 보호를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중동 석유수송로를 둘러싼 안보 우려와 냉전기 소련 견제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성일 박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1차 정책결정 기록을 분석해, 실제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해상수송로 안보가 군사력 사용의 주된 결정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1980년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페르시아만 지역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특히 1984년 이후 이란이 유조선 공격에 본격 가담하면서 미국은 페르시아만 항행 자유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3년 말부터 군사 대응 가능성을 검토했고, 1987년 쿠웨이트 유조선 11척을 미국 국적 선박으로 재등록하여 해군의 보호 하에 호송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 소련 견제나 중동 전략적 이해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장성일 교수는 정책결정자의 실제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 분석을 재구성했다. 연구는 레이건 대통령 주재의 NSPG 회의, NSDD 문서, 대통령 보고서 등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레이건 행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은 초기부터 해상수송로 안보를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3년 NSDD-114, 1984년 NSDD-141 등은 해상수송 보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고, 실질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군사 개입 방식이 검토되었으나, 미국은 국제 공동 대응보다 독자적 개입을 선택했다. 이는 다자협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군사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보호 대상은 중립국 소속의 유조선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라크 지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연구는 이 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견제도 일정 부분 고려되었으나, 실제 논의 내용이나 정책 문건에서 소련 요인은 해상수송로 안보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NSPG 회의록에서도 소련 개입 가능성은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정책결정자들의 핵심 관심은 해상 항로의 안정적 확보였다.
정책결정자들은 특히 ‘항행의 자유’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송 보호를 넘어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해상수송로 안보를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란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군사력 사용 외에도 외교, 정보전, 국제 공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었으나, 결정적 순간에는 해군 호송이 선택되었다.
1987년 결정은 냉전기 미국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소련은 쿠웨이트의 요청에 따라 자국 유조선을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이 중동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은 소련 견제 자체보다, 소련에 대응할 명분을 갖춘 선제적 대응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장성일 박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상수송로 안보가 단순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 사용이라는 외교정책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작용했음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국제정치구조 중심 분석을 보완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해상수송로 안보가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사례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해상수송로는 미·중 전략경쟁, 대이란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미국 외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오만만 유조선 공격 사건, 미국 무인기 피격 사건 등은 해상수송로 안보가 여전히 군사력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는 해상수송로 안보가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인과모형 개발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https://doi.org/10.17331/kwp.2022.38.2.002
유튜브:
https://youtu.be/gpJ73a3TBNs
1987년 美 유조선 보호 결정, 해상수송로 안보가 핵심이었다
엄기홍 기자
|
2025.09.01
|
조회 91
정책결정자 기록 분석 통해 소련 견제보다 해상수송로 안정이 주요 요인임을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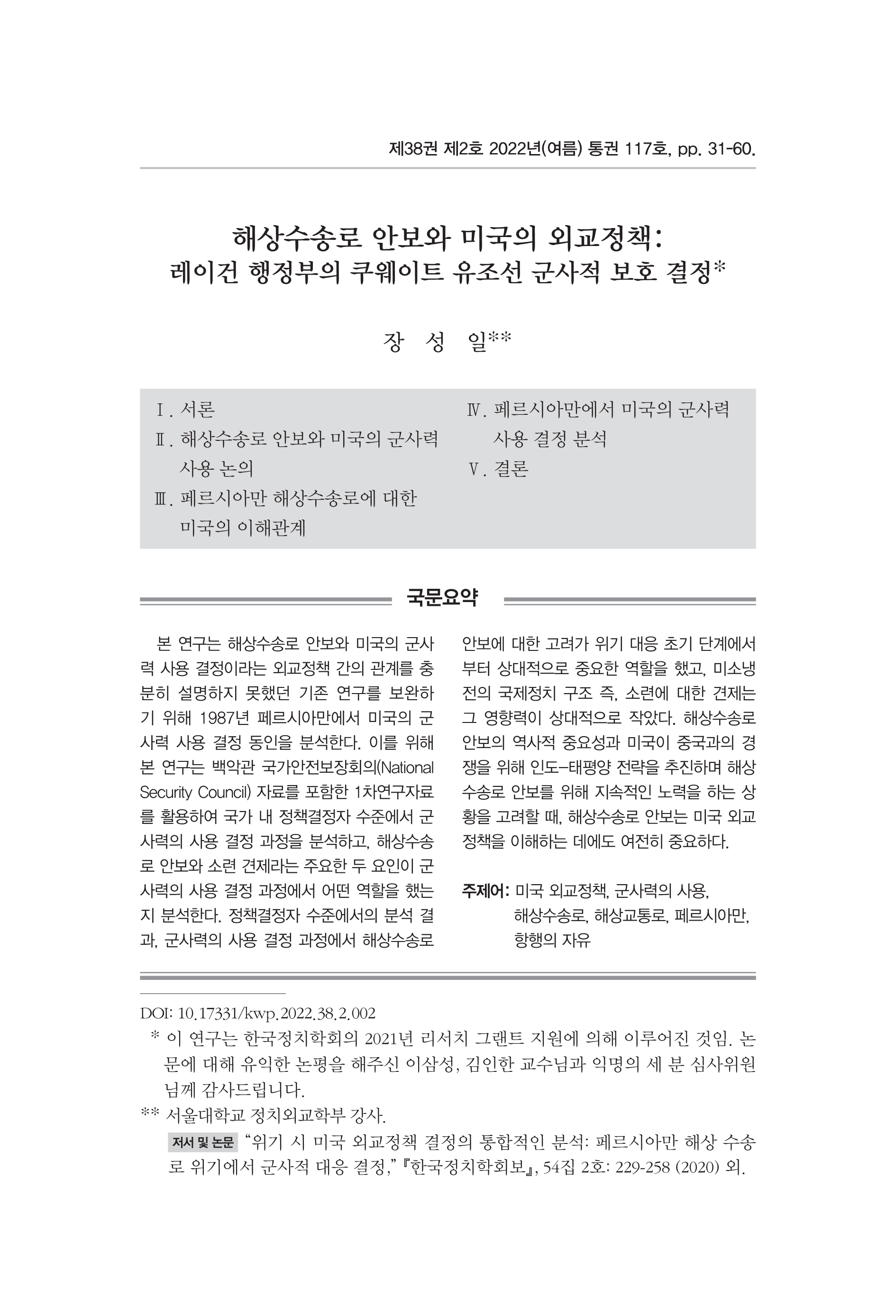
출처: 한국과 국제정치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