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중시 노선과는 다른,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 외교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단순한 수사적 외교가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임을 주장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안보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8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그 수는 총 47개국에 이르렀다. 이러한 확대는 전통적 ‘한반도 중심’ 안보전략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해석을 낳는다. 첫째, 미국이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후퇴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이 안보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이 자국 위상과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두 해석 모두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동기는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내 한국의 ‘위상 권력(positional power)’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47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중 실질적 응집력(cohesion)을 갖춘 관계는 일부에 불과하다. 호주, 일본, 필리핀과의 파트너십만이 다층적 협력체계, 정보공유 협정, 정례 2+2 회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에서 핵심 허브로 기능하는 국가들로, 한국이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 내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호주는 미국의 남반구 전략적 거점이자 AUKUS, FPDA 등 다자 안보 체계의 중추다. 한국은 호주와 2021년부터 공동 군사훈련 ‘해도리-왈라비(Haedori-Wallaby)’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격 훈련에 자국 무기를 직접 투입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상호군수지원협정(RAA) 체결도 논의 중이다.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도 재정비되고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복원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와 해양 감시 역량 증강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후,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며 ASEAN 대상의 해양 역량 지원에 나섰다.
필리핀과는 2024년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이는 ‘S-쿼드(S-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연합훈련 구도 속에서, 한국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필리핀 공동성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행위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파트너십의 표면적 다변화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응집력이 높은 파트너십은 대부분 미국 안보망과 직결되는 구조임이 드러난다.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위 수용’(subordinate acceptance)하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오히려 네트워크 내 위상 강화라는 전략적 계산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이 자국 주도의 미니레터럴 안보체계를 적극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별다른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 내 전략적 소외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일본은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RAA를 체결하며 다자 군사훈련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기능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한국이 자국 안보를 다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주도 네트워크 내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결론짓는다. 특히, 호주, 일본, 필리핀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사적 외교를 넘어서, 다층적 협력 구조와 공동작전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얼마나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대북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미국 전략에 순응해왔다는 점에서, 대전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향후 한국 외교안보의 실질적 기반이자, 네트워크 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논문: http://dx.doi.org/10.17937/topsr.35.3.202509.29
유튜브:
https://youtu.be/Z-Ys4ZGacj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lUxoen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미국 중심 안보망 내 ‘위상 강화’ 전략인가
엄기홍 기자
|
2025.11.03
|
조회 109
“중추국가” 역할 자임 속, 호주·일본·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이 핵심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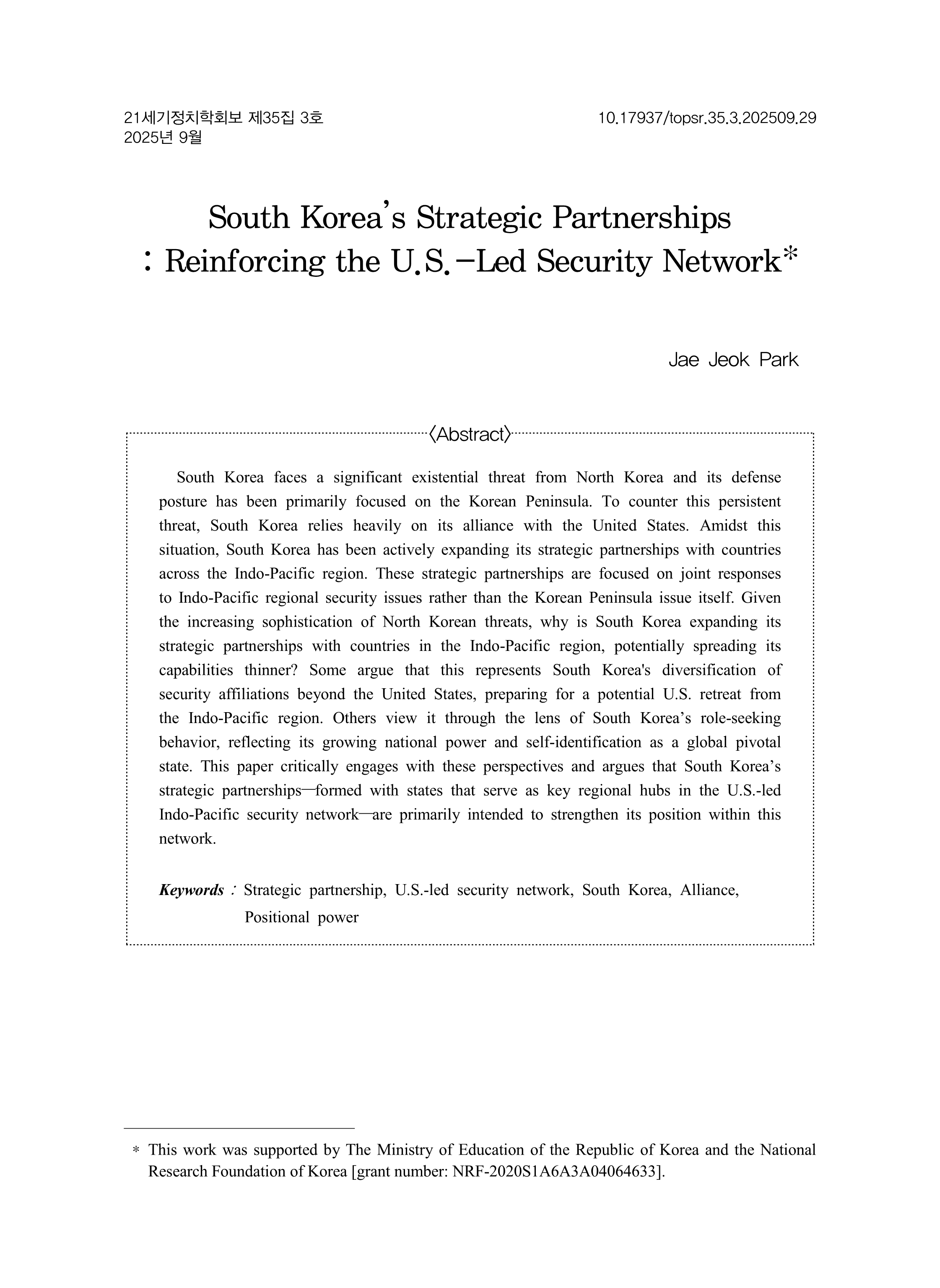
출처: 21세기정치학회보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