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호 『코리아옵서버(KOREA OBSERVER)』에 실린 이선우·이재묵 교수의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하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연구진은 대통령제에서는 헌법상·정치상 제약으로 인해 책임총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사례가 유일한 ‘예외’라고 주장한다.
헌법상 한국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내각 구성·운영에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총리는 헌법상 권한이 열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충실한 보좌역’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야 모두가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이를 실현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된 현실로도 입증된다.
총리의 실질 권한을 가늠하는 정치적 자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민적 인기,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 자원들로도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가 독립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본다. 높은 지지율은 일시적이며, 대통령의 신뢰 또한 권력 위임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국회 장악력은 대부분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 ‘책임총리’에 근접한 유일한 사례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재와 맺은 ‘DJP 연합’에 기반한 공동정부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김대중 후보는 충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과 선거연합을 맺었고, 그 대가로 김종필을 총리로 지명하고 내각의 절반을 연합 파트너에게 배분했다.
김종필은 연합의 분열 시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예산 기획처를 청와대 산하로 이관하려던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내고, 실질적인 경제 운영을 총리 중심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비슷한 정치적 자원이 있었던 다른 총리들-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해찬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 등-조차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총리’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는 권한의 실질적 독립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책임총리’ 제도의 제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합정부의 정치적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 중심의 제도 대신,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제도’를 통한 책임총리 구현은 어렵지만, ‘정치적 조건’이 갖춰질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논문: https://doi.org/10.29152/KOIKS.2024.55.2.247
유튜브: https://youtu.be/yq2HbKj4mto
책임총리제, 대통령제 아래에선 불가능한가
엄기홍 기자
|
2025.05.19
|
조회 152
제도 아닌 정치가 만든 단 하나의 예외, 김종필의 총리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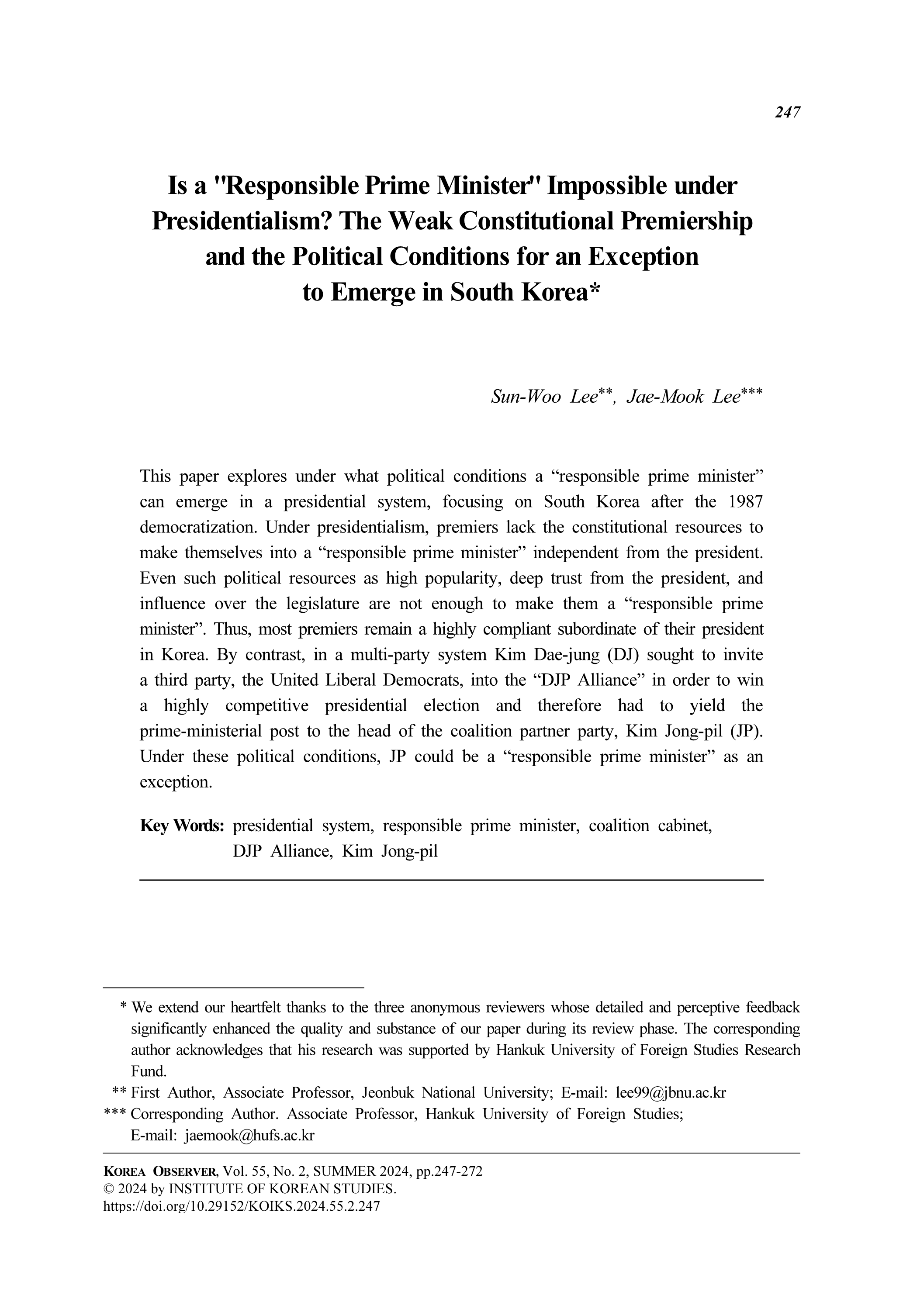
출처: Korea Observer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