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교수와 이재묵 교수는 제21대 총선 직후 전국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의 결정 요인과 그 정치·비정치적 결과를 분석했다. 이들은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당파적 정체성',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을 '정서적 양극화'로 구분하고, 이를 직접 측정해 유권자 양극화 현상의 구조를 정밀하게 밝혔다.
한국 정치에서 양극화는 더 이상 국회나 정당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의 약 70%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논의되어온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개념이 한국 사회에도 뚜렷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기동·이재묵 연구팀은 유권자가 스스로 지지 정당을 얼마나 ‘우리’로 인식하는지, 정당 지지자 간 결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상대 정당 지지자의 성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 당파성과 감정의 경계를 정량화했다. 그 결과, 지지정당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외집단 정당 지지자와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 특성 평가 등은 정서적 양극화의 정도에 비례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상대 정당 지지자와의 결혼에 대해 ‘불쾌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지 정당 지지자에 대해서는 ‘애국적’이고 ‘정직하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 반면, 상대 정당 지지자에게는 ‘편협하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감정의 격차는 일상적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소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형성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아닌, 정당을 ‘내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쟁점에 대한 입장 강도, 이념적 성향이 높을수록 감정적 양극화의 폭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당일체감(당에 대한 일반적 호감도)은 정서적 양극화와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파적 정체성이 단순한 지지 수준을 넘어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 유권자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미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개인 정체성과 결부된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적 의사소통의 정상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선, 당파적 소속감과 감정적 반감을 구분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무당파 유권자의 정체성이나 정치혐오에 따른 비대칭적 반감도 향후 연구 및 제도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논문:
https://doi.org/10.18854/kpsr.2021.55.2.003
유튜브:
https://youtu.be/b0e—X1_iwY
정당은 '우리'이자 '그들'… 감정의 선으로 갈라진 유권자
엄기홍 기자
|
2025.04.11
|
조회 214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그 실증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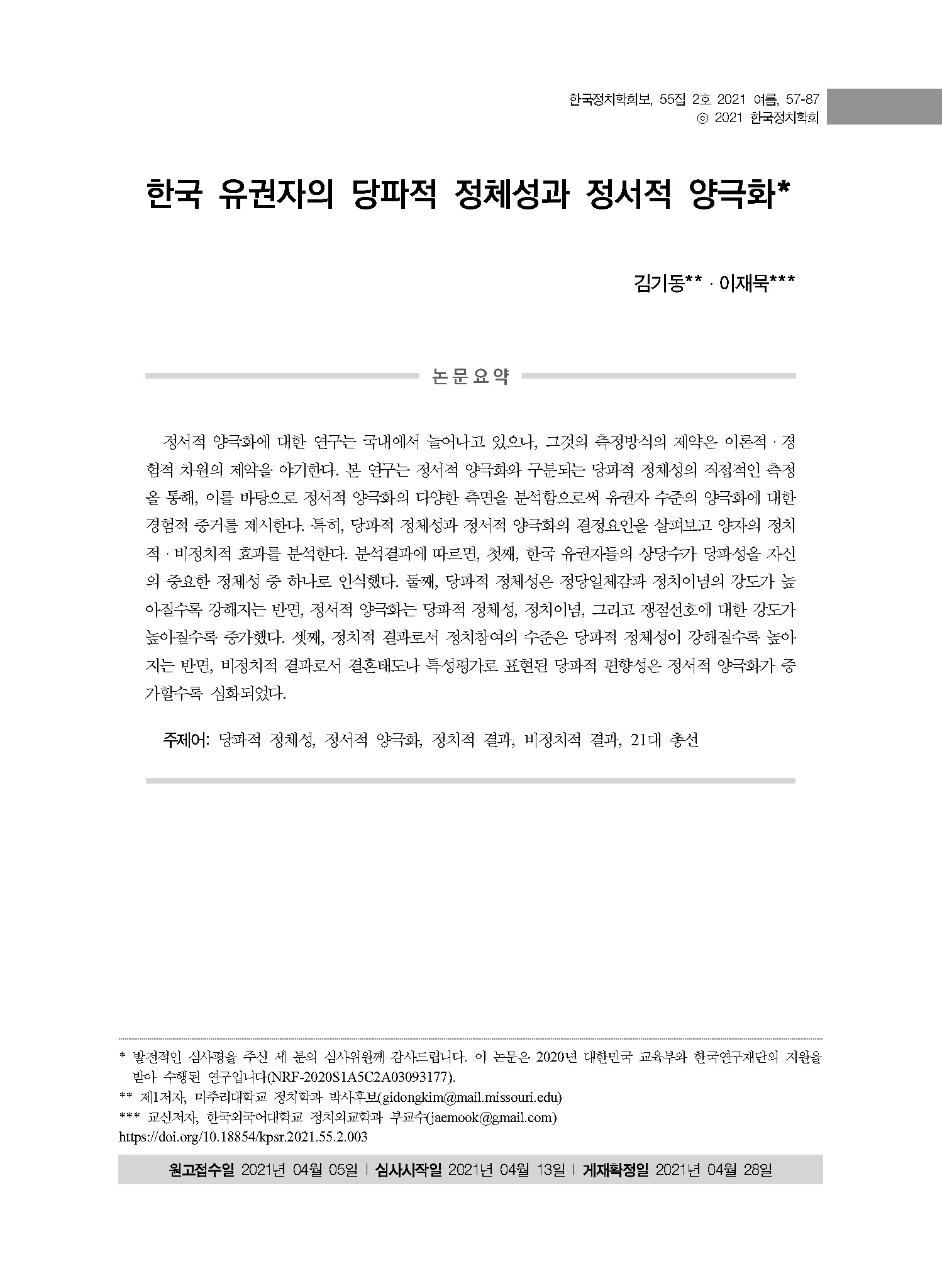
출처: 한국정치학회보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