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이태동 교수와 스티븐 모건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해,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진동’이 정치적 연합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대통령 권한 집중과 정권별 연합 구도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장기적·일관적 에너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개발해 왔다. 2008년 이전까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확대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정치화되었다. 이후 보수 정부(이명박·박근혜·윤석열)는 정치권·관료·원전 산업·원자력 전문가 집단이 결합한 ‘친원전 연합’을 기반으로 원전 확대를 추진했고, 진보 정부(문재인)는 정치권·시민사회·탈원전 전문가 집단의 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203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3GW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역시 기조를 이어가며 원전 수출에 주력했으나, 원전 부품 비리와 안전성 논란이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원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으나, 시민배심단의 찬성 결정과 재생에너지 공급 한계로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포함한 확대 계획을 내놨다.
연구는 이러한 변동을 ‘진동하는 단속평형(oscillating punctuated equilibrium)’으로 설명한다. 기존의 점진적 변화가 외부 충격-후쿠시마 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깨지고,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가 정권 교체 시 급격한 정책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 요인만으로는 이러한 주기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정치적 연합 구도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책 진동은 장기 투자와 인프라 계획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 원전 확대 시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고, 축소 시 다시 원전 확대론이 부상하는 제로섬 구도는 에너지 전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특히 원전 수출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초당적으로 추진되지만, 국내 원전 비중 조정 문제는 정치적 대립이 지속된다.
연구는 향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고, 시민·전문가·정치권이 참여하는 합의 기반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이를 위해 공론화 제도의 보완, 정책 일관성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정권 교체에도 유지 가능한 국가 에너지 비전 수립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향후 국회 논의와 법안 발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정치적 연합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진동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http://dx.doi.org/10.20973/jofp.2024.14.2.79
유튜브:
https://youtu.be/-sMA6XCGuvs
정권 교체에 따른 원자력 정책 진동, 정치적 연합이 좌우한다
엄기홍 기자
|
2025.08.08
|
조회 439
2008년 이후 한국 원자력 비중의 반복적 확대·축소, 대통령 권한과 정치적 연합 구조가 핵심 변수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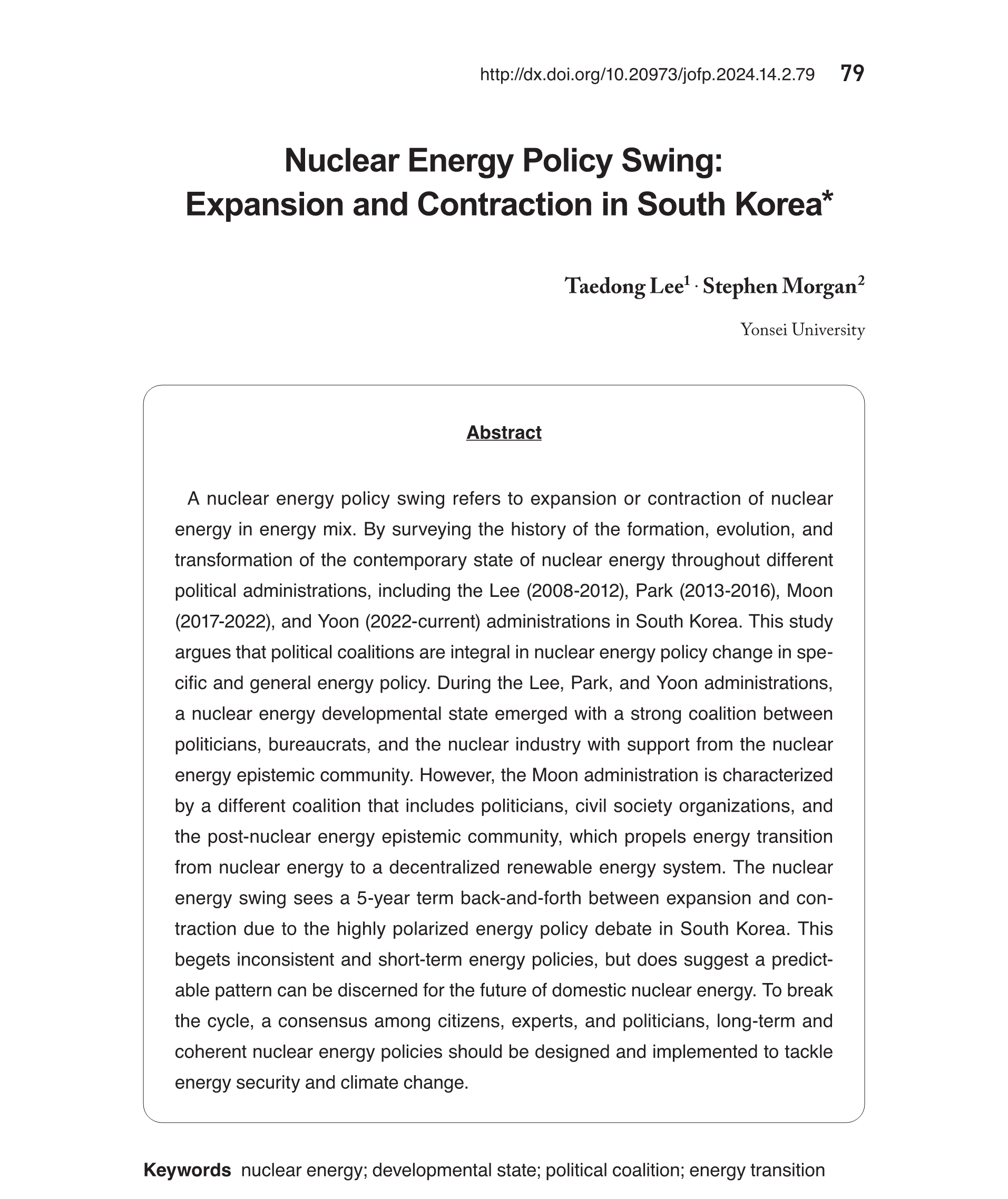
출처: 미래정치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