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2021년 11월 전국 유권자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유권자의 실업률 회고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개인의 고용 안정성과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실업률 인식의 정치적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학회보」 2025년 여름호에 게재되었다.
실업률은 거시경제 지표로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오랜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개인 수준에서 실업률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정치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기존의 경제투표 연구들은 주로 ‘국가경제 평가’나 ‘개인경제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업률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2021년 11월)를 대상으로, 실업률 회고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선거학회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이 수행한 설문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주요 변수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실업률 회고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이며, 통제변수로는 국가경제 및 개인경제 회고평가, 정치이념, 정당일체감, 성별, 세대,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유권자가 실업률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반대로 실업률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한 경우 부정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높고,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유권자 집단에서는 실업률 회고평가가 대통령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변수(interaction terms)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업률 인식의 영향력은 고용 안정성이 낮거나 주관적 계층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관측되었다. 직업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업률 변화가 정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업률 회고평가가 다른 경제지표(예: 국가경제 평가)보다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가이념과의 상관계수는 국가경제 평가가 -0.213, 실업률 평가는 -0.110으로, 후자가 더 낮았다. 이는 실업률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실업률과 같은 구체적 경제지표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업률 인식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선거 여론조사 설계나 정책 평가 모델에 있어 유권자의 구조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시점(문재인 정부 말기)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향후 보수정당 집권기나 실업률이 낮은 시기의 비교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정당, 정책 담당자, 입법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률 지표를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닌 정치적 반응 지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논문: https://www.riss.kr/link?id=A109792582
유튜브:
https://youtu.be/AprkAObLqkk
유권자의 실업률 인식, 대통령 평가에 영향…고용 안정성과 계층 인식이 변수로 작용
엄기홍 기자
|
2025.07.22
|
조회 131
신정섭 교수, 문재인 정부 시기 자료 기반으로 실업률 회고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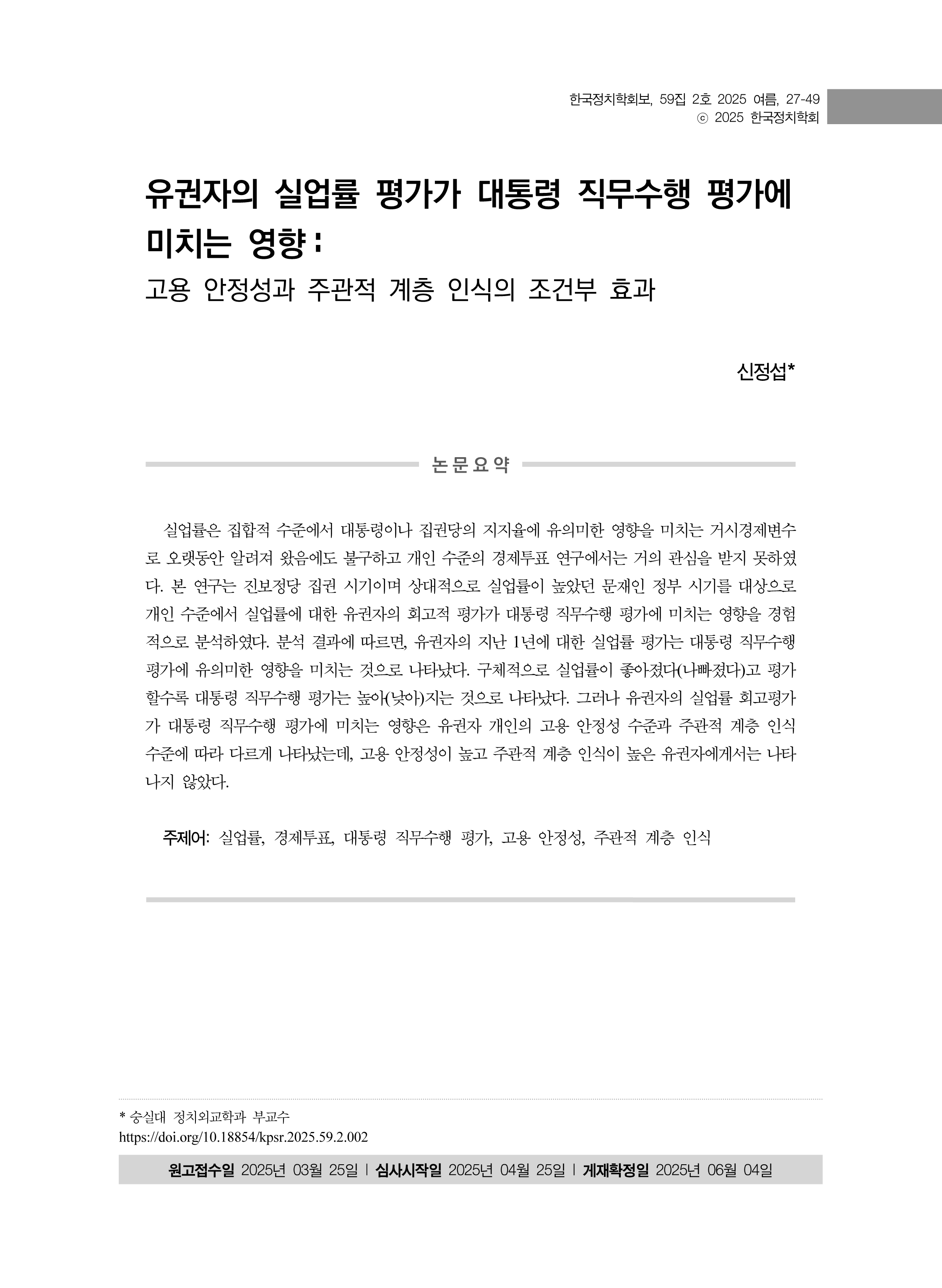
출처: 한국정치학회보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