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외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의 법적·정치적 동학을 분석했다. 유럽의 제도적 진전과 일본의 보수적 고착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외국인의 정치 참여권, 특히 선거권을 둘러싼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민희 교수는 『의정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외국인 참정권을 시민권 부여를 통한 간접방식과 국적 없이도 선거권을 허용하는 직접방식으로 나누고, 후자의 국제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주요 사례를 비교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조약을 통해 EU 국적자에게 지방 및 유럽의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출신 외국인에게까지 참정권을 확대하는 데에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 독일은 일찍이 장기거주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으나, 199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귀화 없는 참정권 부여가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제도화에 실패했다. 다만 이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이중국적 일부 허용과 귀화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정치적 권리를 간접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움에도, 전국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좌절됐다. 이는 정치적 민감성과 시민 정체성의 경계가 외국인 참정권 허용의 실질적 장애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영국은 식민지 시기의 흔적으로 영연방 국적자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을 부여해왔으나,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에 대한 권한은 제한되었다. 2022년 선거법 개정으로 EU 시민의 참정권은 2020년 1월 이전 입국자에 한해 인정되며, 그 외는 개별 협정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은 헌법상 외국인 참정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입법화의 문턱은 높다. 보수 성향의 자민당 주도로 정주 외국인, 특히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요구가 반복적으로 무산되었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도도 강한 반발 여론으로 철회되었다. 일본 내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투표권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고민희 교수는 이들 사례를 통해 외국인 참정권이 단순한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민 개념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정치·법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유권자는 2007년 7천 명에서 2023년 10만 명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참정권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장벽 앞에 있다. 독일처럼 귀화를 통한 권리 확장을 유도할 것인지, 영국처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점진적 확대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지역별 시범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에 따라 입법 전략은 달라질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 참정권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법치주의의 탄력성을 동시에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
https://doi.org/10.15820/khjss.2021.47.3.002
유튜브: https://youtu.be/ysN2yVnjchU
외국인 참정권, 시민권 넘어선 정치적 과제로
엄기홍 기자
|
2025.05.07
|
조회 208
독일·룩셈부르크·영국·일본 사례로 본 외국인 참정권의 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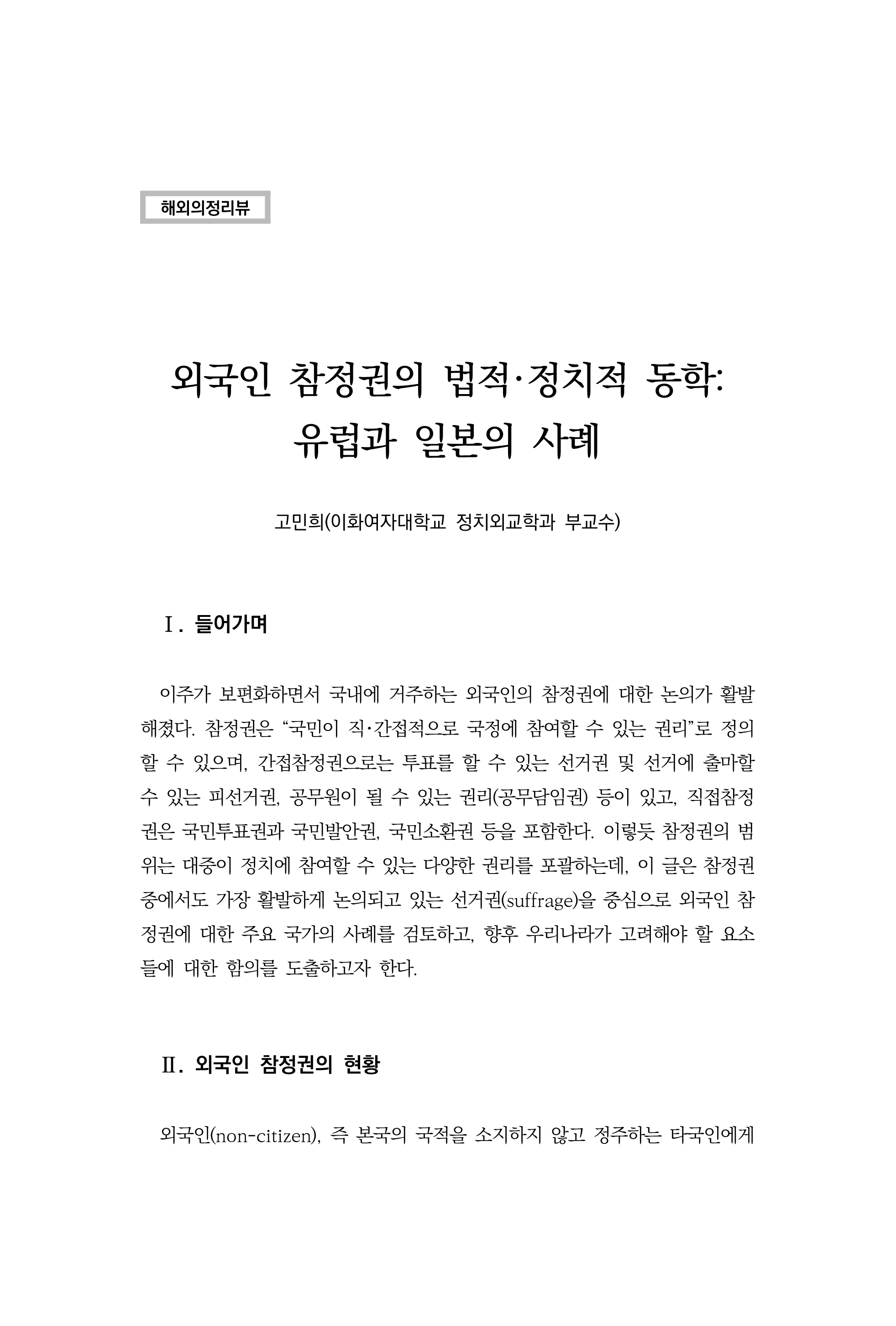
출처: 의정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