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습 정권은 어떻게 3대째 안정적으로 이어졌을까? 전북대학교 박경미·박성용 교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현지지도’ 기사를 분석해,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단순한 가족 승계가 아닌 정치적 동원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밝혀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다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례 없는 3대 세습 체제를 수립했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풀어가는 실마리로, 북한 지도자들의 ‘현지지도’ - 즉, 전국 각지의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를 주목한다.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61건의 현지지도 기사를 분석했다. 놀랍게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일성 시기에 비해 약 4배나 많은 현지지도가 이뤄졌다. 특히 세습이 진행되던 2009~2012년 동안 김정은은 무려 587회의 현지지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이 현지지도는 단순한 홍보용 행사가 아니었다. 김정일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군부 중심의 ‘선군 정치’를 추진하며 군 관련 시설 방문 비율을 높였고, 김정은은 문화 시설에 대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이는 2012년 「문화유산 보호법」 제정과 같은 문화 중심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또한 현지지도에는 핵심 정치 엘리트들이 동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세습 기간 동안 동행한 간부들은 평균 70세를 넘는 고령자였으며, 대부분 조선노동당 출신 인사들이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국내 교육을 받은 인사의 비율이 증가해, 세대 간 충성 기반을 재구축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현지지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 정부, 군을 넘나들며 권력의 고리를 형성하는 ‘회전문식 인사’의 전형이었다. 이 구조는 충성심 기반의 폐쇄적 엘리트 재생산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외부의 제재와 내부의 위기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은 배경에는 ‘현지지도’라는 정치 기술이 있었다. 지도자의 권위를 직접 체현하고, 충성 기반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후계자의 정통성을 제도화하는 이 전략은 단순한 행사 이상이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부 반발이 아닌 체제 지속성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논문: https://doi.org/10.29152/KOIKS.2022.53.2.301
유튜브: https://youtu.be/wsvpbWsRFbs
북한 3대 세습 성공 비결은 ‘현지지도’? 북한 권력승계의 숨겨진 기제
육태훈 기자
|
2025.05.21
|
조회 392
김정은 정권 내부 저항 가능성 낮은 이유, ‘현지지도’에 담긴 정치적 전략에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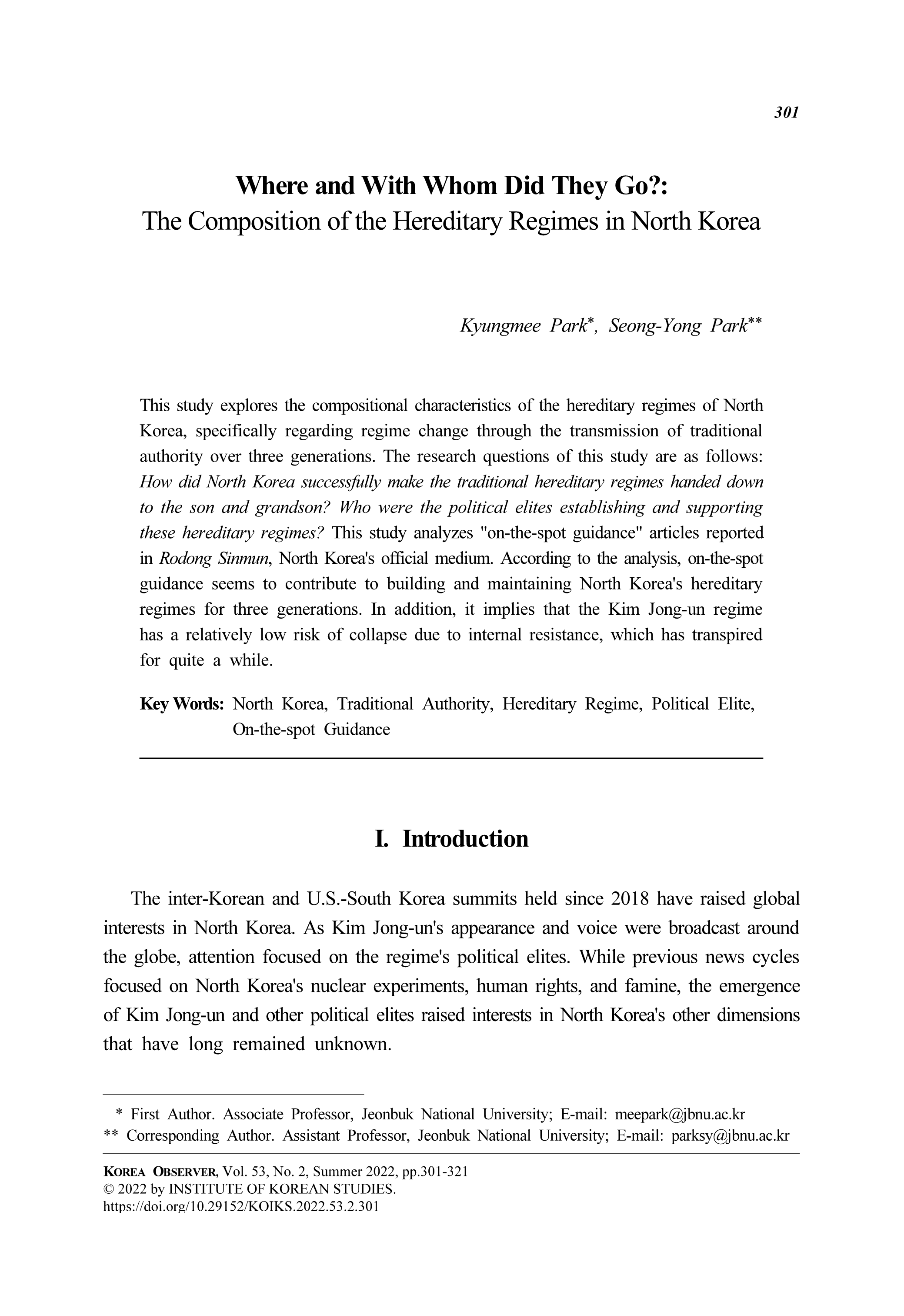
출처: Korea Observer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