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배경을 분석하며, 구조적 요인에 더해 협상 당사자 간 인식 격차가 핵심 변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과 미국의 요구 간 괴리가 협상 좌절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은 냉전 이후 가장 평화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두 회담 모두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수는 기존의 ‘구조적 접근’을 넘어서, 협상 당사자들의 인식과 심리에서 실패 원인을 찾는다.
논문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활용되는 '비용 신호(costly signal)' 개념을 바탕으로, 신호를 보내는 국가(북한)와 이를 해석하는 국가(미국) 간 인식 차이를 집중 조명한다. 북한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고,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현했으나, 미국은 이를 불충분하고 되돌릴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과 인지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특히 ‘신호자의 딜레마(dilemma of costly signals)’ 개념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Smax)와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뢰 비용(Rmin)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점진적 비핵화를 원한 반면, 미국은 전체 핵 목록 공개 및 완전한 검증을 선결 조건으로 삼았다. 문제는 이 간극이 수치화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심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미국이 북한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는 세 가지 심리적 편향도 지적한다. 첫째, ‘희생 간과(overlooking sacrifices)’는 상대국의 안보 불안을 무시하는 경향이다. 둘째, ‘나이스 가이 오류(nice guy fallacy)’는 자국의 평화적 의도를 상대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과신이다. 셋째, ‘기존 신념(prior belief)’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 신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과거 협상 실패 이력은 미국의 요구 수위를 높이고 북한의 수용 한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구조주의적 접근, 즉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은 완전한 검증 없이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인지적 차원을 보완하며 설명력을 확장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협상 과정의 실패가 단순한 전략 부재가 아닌, 당사자 간 상호 인식 오류로도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교수는 상호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재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국이 감내할 수 있는 ‘신호 비용’의 현실적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제3자가 양국 간 인식 차를 조정하고, 안전 보장을 매개할 수 있는 외교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향후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된다면, 신호의 해석 기준부터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비핵화 협상을 넘어서, 국제협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논문 보기:
https://doi.org/10.1111/pops.12789
* 유튜브 보기: https://youtu.be/JqALGo-dLik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비용 신호’ 인식 차가 결정적이었다
엄기홍 기자
|
2025.04.08
|
조회 186
“상대가 감당해야 할 희생의 크기”에 대한 오해가 합의 불발의 핵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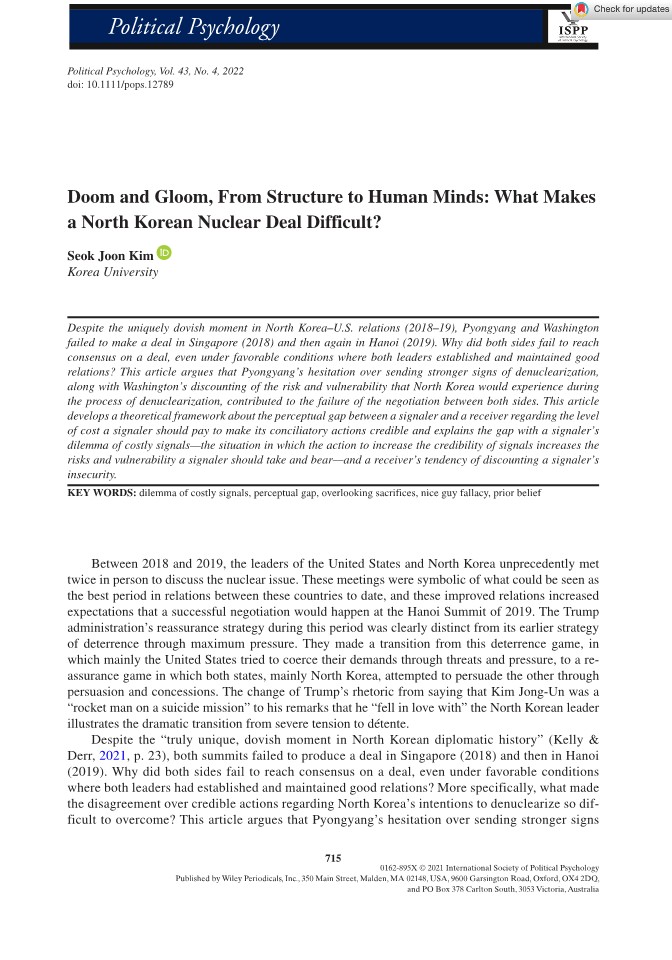
출처: Political Psychology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