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박경미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1962년부터 1987년까지 제3~5공화국의 집권세력이 도입한 정치제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파편화함으로써 정권 유지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정당공천 의무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왜 제도적 통제가 야당의 응집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해명한다.
제3공화국 이후 군사정권은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를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공정선거를 가장한 통제를 일삼아왔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야당’이라는 표현 대신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용한 이유로, 많은 무소속 후보와 당적을 변경한 인물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반대세력은 6·8 부정선거나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지지를 확대하며 집권세력의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당공천 의무제를 폐지하고, 도시지역 의석 확대 명분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기존 연구는 이를 도시지역 의석 확보용으로 해석해왔지만, 박 교수는 “제도의 효과는 단순한 의석 확보가 아니라 반대세력의 응집 저지와 파편화에 있었다”라고 보았다.
실제로 제4공화국 당시 무소속 후보는 전체의 45.3%에 달했고, 제5공화국 총선에서는 17개 정당이 참여했다. 이는 제도 변화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선자 수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 정치적 반대세력은 의석 비중은 늘었지만 정당 간 분산과 후보자 난립으로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평균 득표율의 분산폭은 커졌고, 동원투표의 가능성이 높았던 제5공화국에서는 투표율 증가가 집권당 1순위 후보의 득표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반면, 반대세력의 득표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제도 자체가 반대세력의 선거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선거제도 효과 분석을 넘어, 집권세력이 제도 개편을 통해 어떻게 정권 안정을 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무소속 허용’이라는 개방적 조치는 오히려 정당 결집을 해체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박 교수는 결론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의 선거제도 논의, 특히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반대세력 분열 효과가 중선거구제와 무관하지 않았던 만큼,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양당제 재현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만으로는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정당정치의 내실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을 강조한다.
논문: https://doi.org/10.30992/KPSR.2023.09.30.3.5
유튜브: https://youtu.be/zZwEPJS0TW4
반대세력 분열을 유도한 제도: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 의무제 폐지
엄기홍 기자
|
2025.05.20
|
조회 317
제3~5공화국, 선거제도 통해 반대세력 약화 전략 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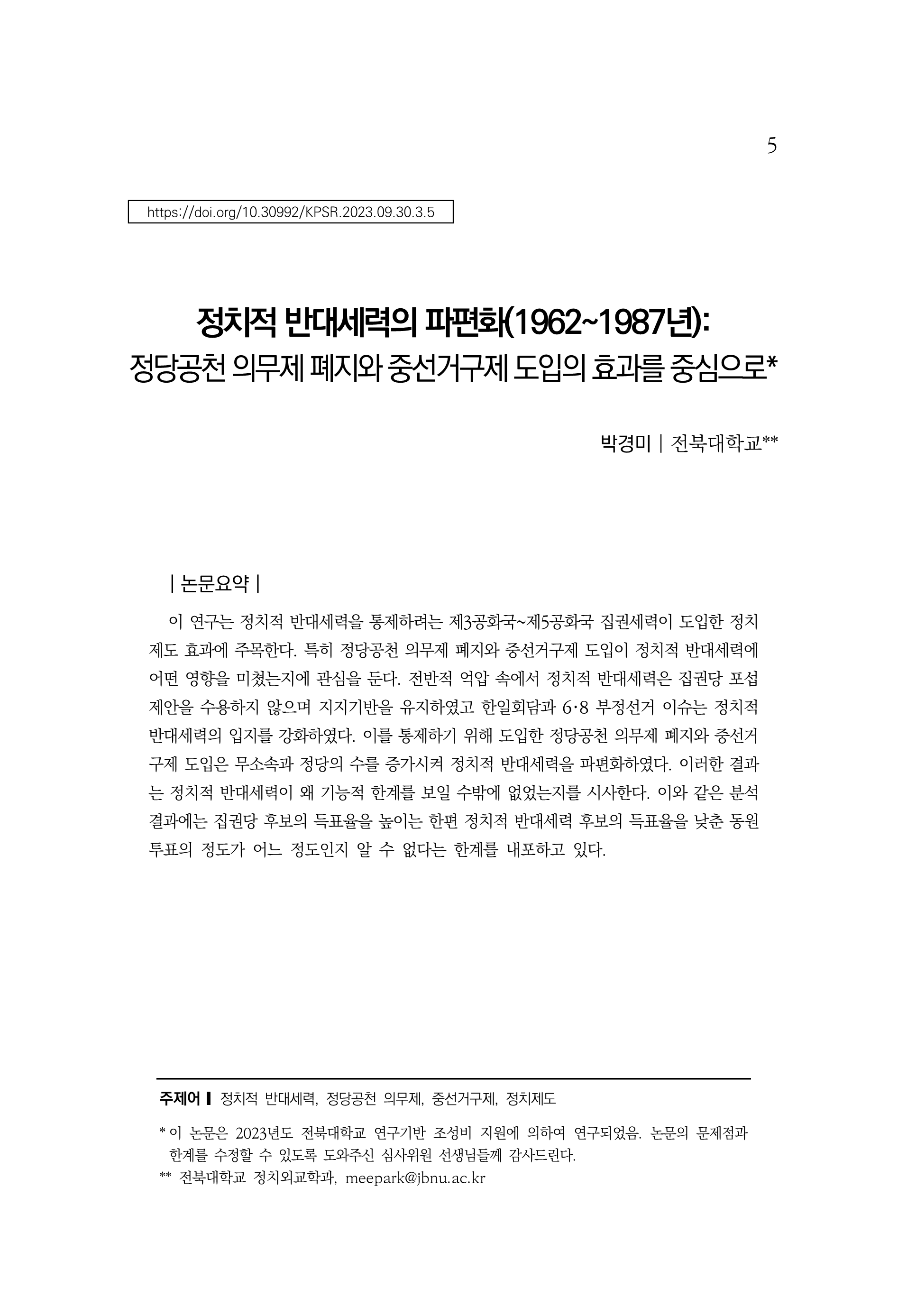
출처: 한국정당학회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