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전국 성인 2,0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가림(성균관대)과 남윤민(공주대)은 인터넷 기반 정치 정보 소비가 정서적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GSEM)을 통해 이 연구는 온라인 매체 이용 자체보다 '가짜뉴스 노출'이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분석 결과는 인터넷 정치 정보의 소비 방식보다는 그 내용과 진위 여부가 감정적 극단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지지 정당에 대한 애착과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는 감정적 분열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은 점차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는 인터넷 미디어, 특히 정치 유튜브와 SNS의 급격한 확산이 있다. 하지만 그 작동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이용’이 아닌 ‘가짜뉴스 노출’이 정서적 양극화의 결정적 경로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응답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하나를 지지한다고 밝힌 경우에 한해 정서적 양극화 점수가 산출되었으며, 이는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로 측정되었다. 핵심 분석에서는 온라인 매체 활용, 정치 유튜브 시청 여부, 그리고 가짜뉴스 노출 경험을 주요 변수로 삼았으며, 가짜뉴스 노출이 실제로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석 결과, 온라인 매체 이용이나 정치 유튜브 시청은 정서적 양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짜뉴스 노출은 정서적 양극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매체와 유튜브는 가짜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 노출을 통해 유권자의 내집단 동일시와 외집단 혐오가 강화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을 넘어서,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GSEM)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치 유튜브 시청이 직접적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가짜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 노출이 다시 정서적 반응을 극단화하는 구조를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매체 이용 빈도 자체보다 정보의 내용과 진위성이 정서적 양극화를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가짜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 참여의 확대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핵심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고도의 정치 관심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것이 곧 올바른 정보 소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3%가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를 접한 매체는 SNS가 75%로 가장 높았고, 포털사이트, 종편, 인터넷 신문 순이었다. 이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가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 노출시켜,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의 인지된 노출(perceived exposure)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응답자가 자신이 접한 정보를 가짜뉴스로 인식했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이 측정 방식은 객관적인 노출 여부와는 구분되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 노출보다 응답자의 인식과 감정적 반응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정서 자극 효과는 단순한 허위 정보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회의 교착 상태를 초래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 연구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매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온라인 정보 소비가 자동적으로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내용, 즉 가짜뉴스 노출 여부가 감정적 분열을 촉진한다는 점은 향후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적으로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 정보 전달 수단보다 정보의 내용과 유통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히 ‘더 많이, 더 자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감정 구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 https://doi.org/10.15617/psc.2025.10.31.3.117
유튜브:
https://youtu.be/4FbLUB3W1tM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lUxoen
가짜뉴스가 감정을 흔든다: 온라인 정치 정보 소비와 정서적 양극화의 연결 고리
엄기홍 기자
|
2025.11.05
|
조회 286
정치 유튜브와 SNS의 정보가 곧 양극화를 부추기는가? 핵심은 ‘정보의 진위성’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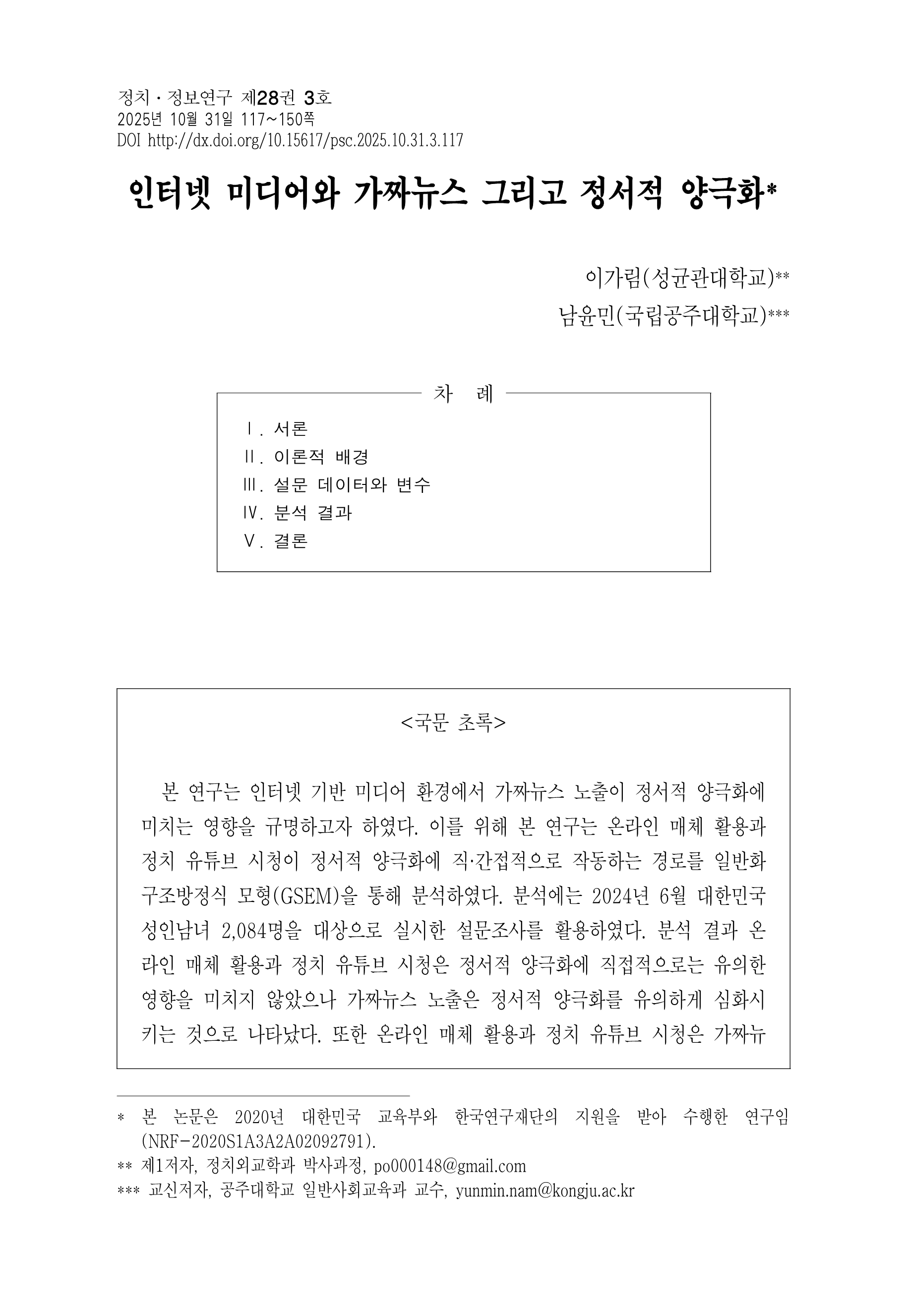
출처: 정치·정보연구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